표충사 소장 대정 17년 용흥사명 청동은입사향완(불교신문, 2024.9.20)
페이지 정보
조회 380회 작성일 24-12-22 12:39
본문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청동은입사향완’

국보 지정된 용흥사명 향완
1957년 8월 문교부 국보고적보존회(國寶古蹟保存會)와 경남도청이 공동으로 실시한 제2회 경남문화재조사 때에 밀양 표충사 우화루(雨花樓)에는 사명대사의 유품이 있었다. 유품 중에는 선조의 하사품이라고 표기된 오동향로(烏銅香爐)가 1점 있었는데, 이 향로는 사찰의 전래품으로 사명대사의 기일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조사 후 같은 해 12월27일 제15회 국보고적명승천연기념물보존회(國寶古蹟名勝天然記念物保存會)의 결의로 국보로 지정되었다.
표충사(表忠寺)에는 국내에 있는 기년명 청동은입사향완 중에서 가장 오래된 ‘대정(大定) 17년 용흥사명(龍興寺銘) 청동은입사향완(靑銅銀入絲香)’이 소장되어 있다. 이 향완은 원형 받침과 나팔형 간주, 전이 달린 몸체로 구성되어 있다. 2단의 받침은 상단은 크고 둥글게 처리하였으나 하단은 낮고 외반되었으며, 상단에는 구름문이 은입사로 표현되어 있다. 나팔형 간주는 선으로 받침과 구분하였고, 한 마리의 용이 간주를 감싸고 있으며, 용 주위로는 태극과 흘러가는 구름문을 은입사로 표현하였다. 용은 몸의 윤곽선과 비늘은 선으로 은입사를 하였고, 발톱과 뿔은 면으로 은입사를 하여 강조하고 있다. 간주의 상단에는 여의두문(如意頭文)을 띠로 표현하였고, 받침과 연결되는 간주 위의 원륭대에는 쌍엽칠보문(雙葉七寶文)을 은입사로 표현하였다. 몸체 하부에는 1단의 받침을 두고 동심원을 은입사로 표현하였다. 이 향완에서 주목되는 것은 몸체 하부의 연판문 장식대로 이 청동은입사향완에서 처음 나타난다.
몸체 중앙에는 굵고 가는 이중동심원 안에 4자의 범자(梵字)를 은입사로 표현하였다. 구연의 전에는 이중동심원 안에 6자의 범자를 은입사 하였고, 범자 사이에는 구름문, 전의 테두리에는 흘러가는 구름을 은입사로 표현하였다. 그리고 구연의 전 밑면에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효초스님 동량으로 1177년 조성
‘대정 17년 용흥사명 청동은입사향완’은 구연의 전 밑쪽과 받침 안쪽에 명문이 새겨져 있다. 구연의 전 밑쪽에는 “大定十七年丁酉六月八日(대정십칠년정유유월팔일) 法界生亡共增菩提之願以鑄成靑銅含銀香一副重八斤印棟梁道人孝初通康柱等(법계생망공증보리지원이주성청동함은향완일부중팔근인동량도인효초통강주등) 謹發至誠特造(근발지성특조) 隨喜者射文(수희자사문)”, 받침 안쪽에는 “昌寧北面龍興寺(창녕북면용흥사)”라는 명문이 새겨져 있다.
구연의 전에 새겨진 명문에 따르면, 이 향완은 대정 17년인 1177년 효초(孝初)스님이 동량(棟樑)이 되어 “법계생망 공증보리(法界生亡 共增菩提)”의 원(願)을 세우고 무게 8근의 청동은입사향완 1구를 조성한 것이라는 알 수 있다. 법계의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모두 보리를 더한다는 “法界生亡 共增菩提”는 고려의 12~13세기에 제작된 청동은입사향완과 청동금고에 주로 표현되었던 문구로 ‘대정 9년명 청동금고’, ‘태화 7년 자복사명 반자’ 등에도 나타나고 있다.
받침 안쪽에 점각으로 새겨진 명문은 이 향완이 창녕 북면 용흥사의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 <창녕군읍지(昌寧郡邑誌)>와 <범우고(梵宇攷)>에는 용흥사가 비슬산(琵瑟山)에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원래는 비슬산 용흥사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향완은 효초스님이 동량이 되어 “法界生亡 共增菩提”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연화 활동을 통해 조성한 것을 알 수 있고, 효초스님은 이 향완 뿐만 아니라 금강산 유점사(楡岾寺)의 청석탑(靑石塔) 조성에도 참여하였다.
용흥사명 향완의 문양적 특징
‘대정 4년 백월암명 청동은입사향완’ 단계에 확립된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의 문양요소는 ‘대정 17년 용흥사명 청동은입사향완’ 단계에 들어서는 기존의 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문양이 추가되는데, 몸체 하단의 연판문과 간주의 여의두문이 그것이다. 몸체 하단의 연판문 장식대는 ‘대정 17년 용흥사명 청동은입사향완’에 처음 나타난 이후 ‘대정 18년 금산사명(金山寺銘) 청동은입사향완’, ‘정우 2년 자효사명(慈孝寺銘) 청동은입사향완’,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전(傳) 용문사(龍門寺) 청동은입사향완’과 조선시대에 제작된 ‘순치(順治) 11년 동화사명(桐華寺銘) 청동은입사향완’까지 지속되고 있다.
‘대정 17년 용흥사명 청동은입사향완’의 간주 상단에 표현된 여의두문은 고려시대 청동은입사향완에는 처음 적용된 것으로 13세기 전반 제작된 ‘함평궁주방명 청동은입사향완’에 범자의 표현에 확대 적용되며, 이후에 제작된 청동은입사향완에는 모두 나타나는 문양이다.
범자는 ‘대정 4년 백월암명 청동은입사향완’ 단계에는 이중동심원 바깥으로 톱니무늬가 표현되지만, 이 향완은 이중동심원만 표현되고 있어 차이를 보인다.
‘옴마니파드메훔’ 은입사로 표현
‘대정 17년 용흥사명 청동은입사향완’은 몸체와 구연의 전 윗면에 모두 범자가 나타나는 유일한 청동은입사향완이다. 몸체에는 4자의 범자, 구연의 전에는 6자의 범자가 은입사로 표현되었는데, 이들 범자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
구연의 전 윗면에 새겨진 범자는 옴마니파드메훔( om mani pad me h)의 6자 진언이다. 옴은 모든 진언의 어머니이고, 마니(mani)는 ‘보주’의 의미가 있으며, 파드메(padme)는 ‘연꽃에’라는 의미이다. 훔은 ‘정결 케하여 구원하소서’라는 의미가 있다. 따라서 ‘대정 17년 용흥사명 청동은입사향완’은 ‘연꽃처럼 피어나는 덧없는 세상에 변함없는 보주이시여 정결케 하여 구원하소서’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몸체 4자의 범자는 아, 옴, 흐리히, 훔으로 ‘대정 4년 백월암명 청동은입사향완’의 몸체에 은입사로 표현된 범자와 같은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대정 17년 용흥사명 청동은입사향완’의 몸체의 범자도 ‘대정 4년 백월암명 청동은입사향완’의 4자의 범자처럼 최상의 의미를 가진 4자의 범자를 조합한 것이다.
‘대정 17년 용흥사명 청동은입사향완’은 국내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청동은입사향완이다. 이 청동은입사향완의 문양 중 몸체 하단의 연판문 장식대와 간주 위의 여의두문은 이후 제작되는 청동은입사향완에 영향을 준다는 점에서 청동은입사향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구연의 전 윗면에 옴마니파드메훔 6자의 범자는 이 향완에만 유일하게 은입사로 표현된 예라는 점에서 중요하다. 몸체의 아옴흐리히훔의 4자의 범자는 ‘대정 4년 백월암명 청동은입사향완’의 범자를 따른 것으로 볼 수 있고, 이후 14세기에 제작된 ‘지정 26년 진종사명(眞宗寺銘) 청동은입사향완’에 보이고 있다.
고려시대인 1177년 효초스님이 동량이 되어 조성한 ‘대정 17년 용흥사명 청동은입사향완’은 법계의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 모두 보리를 더한다는 “법계생망 공증보리(法界生亡 共增菩提)” 불교적 소망을 담은 청동은입사향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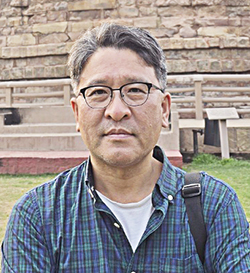 이용진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
이용진 동국대 대학원 미술사학과 교수